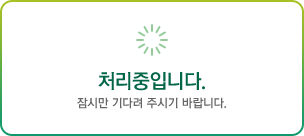- 김복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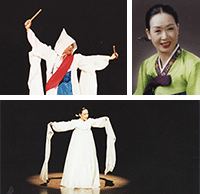
경기도무형유산 제8호 | 승무·살풀이춤
ㆍ 승무
경기도무형유산 제8호 승무는 화성재인청류의 춤으로 조금 연극적인 요소가 전해져 오고 있다. 유래에서 절을 떠나는 대목이 있는데, 북놀이 과장을 끝내고 고깔과 장삼을 벗어 북에 걸친 후 떠나는 아쉬움을 표현하는 춤사위는 다른 류의 승무와 확연히 구별된다. 번뇌를 초월하여 자신이 걸어가야 할 구도자의 길을 포기하면서까지 스승을 살리고자 하는 살신성인의 철학적 의미가 내포되어 유래 속의 이야기가 춤 속에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
ㆍ 살풀이춤
화성재인청류의 춤으로 독특한 배경설화를 가지고 있으며, 그것이 무복과 춤사위에 그대로 반영되어 이야기 속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 수건 두 개로 그려지는 춤사위는 기쁨과 밝음, 극락의 세계에서 효를 완성하는 절정을 표현하고 있다. 또한 한이나 슬픔을 극복하고 자유와 환희의 세계로 승화시킨다는 살풀이춤의 궁극적인 목적을 극대화한다고 할 수 있다.
- 김순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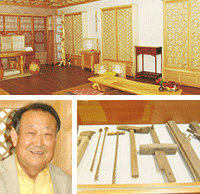
경기도무형유산 제14호 | 소목장
목재를 다루는 목수 장인에는 궁궐이나 사찰 또는 가옥을 짓는 건축과 관계된 일을 하는 대목장(大木匠)과 창호, 장롱, 문갑, 경대 등 목공예품을 만드는 소목장(小木匠)이 있다. 창호는 못을 일절 사용하지 않고 잘 다진 나무를 사개물림과 엇갈리게 물리는 방법으로 문살을 만든 다음, 풀로 붙이고 끌을 이용하여 가로와 세로로 구멍을 뚫어 촉을 만든 후 쐐기를 박아 마감한다. 창호의 문살은 그 자체로 예술적 조형미를 잘 표현할 뿐만 아니라, 선과 선이 만들어 내는 여백의 미와 더불어 건축의 격을 상징하기도 한다. 꽃살창호는 궁궐의 정전과 사찰의 대웅전에서 볼 수 있다.
- 김종욱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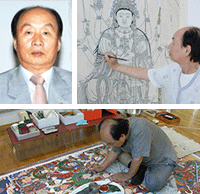
경기도무형유산 제28호 | 단청장
단청은 청색, 적색, 황색, 백색, 흑색 등 다섯 가지 색을 기본으로 하여 궁궐, 사찰, 사원 등에 여러 가지 무늬와 그림을 그려 장엄하게 장식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종사하는 사람을 단청장(丹靑匠), 화사, 화원, 화공, 가칠장, 도채장 등으로 부른다. 승려일 경우에는 화승, 불화에 숙달된 승려는 금어, 단순한 단청장을 어장이라고도 한다. 단청의 목적과 의미에는 기물의 장엄함 외에도 비바람 속에서 보호하려는 의도가 또한 크다 할 것이다. 채색단청은 궁전과 공공건물 및 사원 등 권위와 장엄을 요하는 건물에만 허용되었으며, 일반 민가에 단청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규제했다. 단청의 종류는 빛깔과 무늬의 정도에 따라 긋기단청(외주선만을 단순하게 그음), 모루단청(머리 부분에만 오색무늬를 넣음), 금단청(전면에 오색으로 현란하게 그림), 가칠단청(바탕칠만으로 마무리 지음) 등이 있다.
- 이연욱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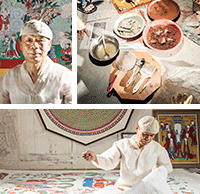
경기도무형유산 제57호 | 불화장
불화는 불탑, 불상 등과 함께 불교의 신앙 대상으로, 제작 형태에 따라 탱화, 경화, 벽화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특히 탱화는 복장식, 점안식 등의 신앙 의식절차를 거쳐 불단의 주요 신앙 대상물로 봉안된다. 우리나라 전통 사찰에 전해오는 탱화는 불화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불화 제작을 담당하는 장인을 특별히 금어, 화승, 화사, 화원이라 부르기도 하였다. 불화는 불교 교리를 알기 쉽게 회화적으로 표현하는 예배용, 교화용 탱화 제작을 주로 하고 있다. 또한 현재 전승 현장에서도 단청과 불화는 각각의 고유한 기술과 역할을 바탕으로 분리 전승되고 있다.
- 담당부서 : 문화예술부 예술교육팀
- 전화번호 : 031-290-35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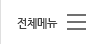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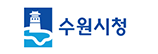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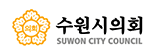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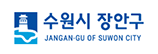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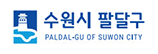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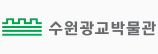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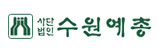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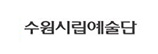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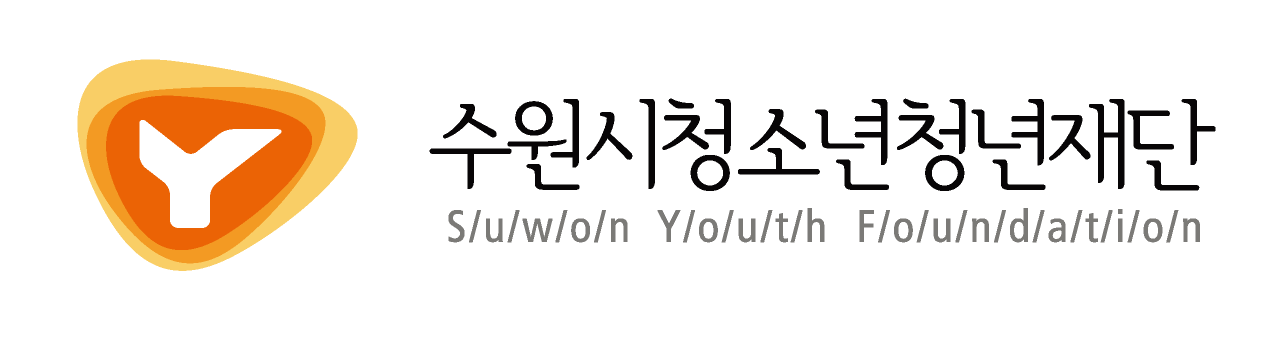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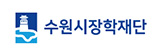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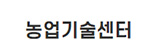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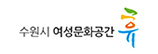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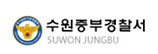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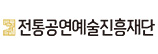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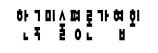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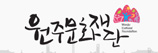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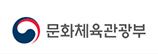

![[재]오산문화재단 로고](/_File/popBanner//imgFile_1471857215_0.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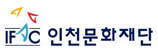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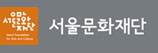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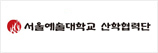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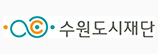











 위로 이동
위로 이동